on
지금 서울에 대한 풍자 – 윤고은, <무중력 증후군>,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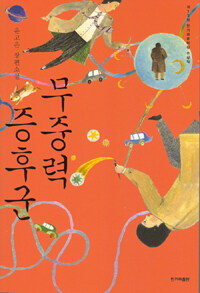
|
무중력 증후군 –  윤고은 지음/한겨레출판 |
노시보 그리고 ‘엄친아’ 형.
이곳은 여덟 번째 회사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 년 동안 다닌 회사 중에 네 곳이 입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망해버렸고, 두 곳은 월급을 주지 않았다. 내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제 발로 걸어 나온 회사는 한 곳뿐이었다. 온라인 게임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내가 구상하는 게임은 모두 지구상에 있었다. 아이디어가 없어서 회사를 그만뒀다. 그리고 이틀 만에 다시 구한 직장이 이곳이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이 회사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다. 한 주가 더 지난 후 지구상에 없는 것들을 찾으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에서는 지구상에 있는 것들만 취급했기 때문이다. 한달이 지난 지금 부동산업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p.12).
실은, 요즘 엄마가 땅을 팔러 다닌다. 55세에 미싱을 하기에는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지 당기기 때문에 무리이고, 그나마 월급 제때 잘 주는 곳은 요즘 프로젝트 부동산 회사 밖에 없다. 이해가 된다. 다만. 25살짜리 노시보가 프로젝트 부동산에 다니는 게 세태의 정확한 반영이라는 면에서 좀 아프다.
딱, 지금 서울 강남, 역삼동이 떠오른다.
이런 인생 늘 패배의 연속. 지쳐 나가떨어진 애인은 헤어지자고 일방 통보하고, 그냥 그런 삶은 시작이다.
그리고 ‘꼭 있을 것 처럼’ 주인공 노시보의 형은 ‘엄친아’이다.
형은 언제나 예외의 삶을 살았다(p.70). 형은 모든 면에서 엘리트였다. 공부는 물론이고, 통솔력도 뛰어났고, 교우 관계는 취향을 알 수 없을 만큼 무난했으며, 매사에 자신감이 넘쳤다. 내가 기억하는 형의 100미터 주파 기록은 18초였다. 운동 좀 한다는 애들의 기록치고는 매우 못 뛰는 축에 속하는 기록이었다. 그런데 형은 100미터를 18초에 겨우 뛰면서도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운동선수 중 하나였다. 참 이상한 일이었는데, 나중에야 그 비결을 듣게 되었다.
“취약 종목을 하면 안 되지. 나는 농구만 한다고.”(p.92)
형이 하는 공부도, 게임도, 독서도, 심지어는 영화 감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형의 진심과는 상관이 없으면서도 형을 만드는 요소들이었다.
“해야 하는 거니까.”(p.93)
달이 두 개가, 세 개가, 그리고 네 개가……
어느날 뉴스에서는 생 난리가 난다. 헤드라인부터 도배되는 ‘달이 두 개가 되었다’는….
“1986년의 크뤼트네와 2002년의 JOO2E를 기억하십니까? 어제 저녁, 제 2의 달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되었습니다.”(p.24)
사람들은 중력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환상에 빠지기 시작하고. 많은 이들이 자신이 ‘무중력자’임을 커밍아웃하기 시작한다. 중력을 끊겠다면서 몸을 던져 지구 연약층까지 뚫어보겠다는 자살의 릴레이.
높은 빌딩에서는 무중력자들의 낙하 실험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무중력자들은 마치 가미가제 특공대나 지하드를 수행하는 이슬람 과격분자처럼 영광스럽게 아래로 뛰어내렸다. 그들은 몸이 중력을 거스를 수는 없어도 영혼은 비상이 가능하다고 믿었다(pp.33-34).
엄마는 달을 보겠다며 집을 나가고….
세상은 미쳐돌아가기 시작한다. ‘두 번째 달’이 그리고 ‘세 번째 달’이 등장하고, 사람들은 그 세계가 주는 ‘중력의 붕괴’에 대해 설레발 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쯤에서 한 번 숨을 고르게 되는 데, 그건 저널 <심플라이프>의 수석기자 송영주(퓰리처) 덕택이다. </p>
“그런 질병이 있어요?”
“시보 씨가 앓고 있잖아요.”
내가 뭘 앓고 있다고? 이게 뭔 소리람!
“무슨 말씀이신지. 전 무중력자도 아니에요.”
“무중력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가만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몰라요? 시보 씨가 무중력자는 아니지만, 그건 시보 씨 생각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시보 씨를 무중력자로 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p.174)퓰리처는 커다란 가방 안에서 한 뭉치의 인쇄물을 꺼내 내 앞에 보여주었다. 퓰리처가 말한 기사는 조만간 뻥 하고 터질 기사의 초안이었다. 달과 관련된 증후군으로 인해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는 내용의 위험한 기사.
“사실이 아니잖아요!”
퓰리처는 다소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그러고는 내 고막 안에 뿌리를 박아 넣을 듯한 말투로 입을 벌렸다.
“그러니까 이제 곧 사실이 될 거라고요. 기사에 내보낸다니까요.”
이번에는 나도 지지 않고 덤볐다.
“사실이 아닌 걸 어떻게 기사로 쓰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퓰리처가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실성이에요. 언론에 실린 이상, 사실이에요.”(p.175)
이야기의 야마(핵심내용)은 여기에 있다.
그럼 달이 증가하는 세상, 어떻게 되었을까?
지옥같은 디스토피아인 현실에서 탈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또 다른 현실세계를 만들어 낼까?
“위기라는 말 아십니까? 뭐, 요즘 뉴스에서 우주 전체의 위기라고 강조들을 해대니, 모르실 리가 없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위기라는 말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즘 위기다 비상사태다 하는데, 이럴수록 우리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어야 하겠습니다. 늘 흔들림 없이 정연한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나무를 어디에 심느냐, 어디에 심겠습니까? 놀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바로 달에다 심는 겁니다”(p.165).
부풀어 버린 풍선 같은 ‘뉴스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놓을까?
무중력자 사이에서도 내분이 일어났다. 그들은 두 파로 나뉘었다. 지구의 중력을 거부하는 데 무게를 두는 급진파와 지구가 온전히 무중력의 휘하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온건파. 급진파는 줄 없는 번지점프를 계속했다. 도시 곳곳에서 사람들의 머리가 땅으로 곤두박질치는 소리가 들렸다. 중력을 거부하고 증발을 택한 이들의 흔적은 아스팔트 위에 하얀 페인트의 실루엣으로 남았다. 사람들은 그 흔적을 피해서 걸었다. 심지어는 밤거리를 배회하는 고양이조차도 그 실루엣을 블랙홀처럼 인식했다. 한 발이라도 내밀면 온몸이 소금으로 녹아버릴 것 같은 공간 말이다(p.143).
빠른 전개, 소재꺼리는……
초반부를 읽으면서 깔깔 거리면서 소설을 읽었다. 그리고 윤고은이라는 작가가 궁금했었는데, 절반을 넘어선 시점에서 내가 ‘사회과학도’라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뻔한 결론이 눈에 보여서 조금 읽기가 느슨했다.
마치 동화책에서 ‘해피엔딩’을 예정하든, 어른들을 위한 우화는 ‘씁슬한 썩소’를 주기 마련인데. 그럴 줄 알았던 결론으로 막 가는 것이었다.
‘희망’을 말하면, 곧바로 ‘희망’을 마켓팅 하려는 시대. 그리고 그 ‘희망’ 마케팅이 활황을 칠 때, 그것은 레드 오션이라며 또 다른 ‘긍정의 삶’ 따위의 ‘행복 마케팅’을 시작하는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미디어의 프레임이 주는 횡포에 대한 우화. 계속 먹잇거리를 찾아다니는 황색 저널리즘.
또한 돌아서서 보면 일상은 이어지고 있기 마련이라는…. 평범한 결론.
업무는 똑같았다. 고객 리스트를 펼쳤다.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나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나 퉁명스러운 사람들이나 상냥한 사람들이나 모두 내 고객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땅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모두 잠재 고객이었다. 내 전화번호부는 어느새 ‘나’ 씨로 넘어가 있었다(pp.279-280).
아무도 망언하지 않았고, 아무도 테러하지 않았다. 어떤 동물도 도로를 점령하지 않았고, 어떤 과자에서도 애벌레가 나오지 않았다. 신문을 장식하는 것은 오로지 기계처럼 움직이는 정치판이나 연예계 뉴스뿐이었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것은 여전했고, 국회의사당에서 크고 작은 ‘게이트’들을 사육하는 것도 여전했다. 그러나 모두 마치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지리멸렬했다. 세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동안, 나는 마치 내가 아무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우울해졌다(p.233).
왜 도대체 열광했는 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바가 별로 없어도, ‘열광의 메커니즘’은 좀 잘 보여준다는 느낌이다.
그리고 윤고은의 ‘기억력’에 감탄하는 데. 2005년의 코끼리 건국대 난입사건을 기억할 줄이야.
 건대 앞 미가(정식이 맛있다).
건대 앞 미가(정식이 맛있다).
상상력에 예찬을, 대신 좀 짧게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잘 돌아보면 딱 지금의 서울 이야기이다. 서울의 사람들을 떠올려 본다. 매일 매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뉴스를 확인하고, 뉴스 하나 하나에 낚여서 춤추고, 곧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판타지의 극한.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