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도시의 뒷켠, 우리의 밑바닥 – 이명랑, <삼오식당>, 뿔,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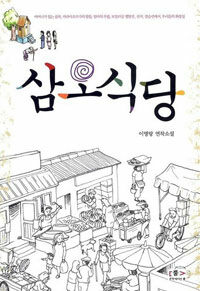
|
삼오식당 –  이명랑 지음/뿔(웅진) |
한국 사회의 20대~40대의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주는 커다란 상징은 ‘뉴요커’이다. 쿨하게 생각하고, 베이글을 곁들인 핸드 드립 커피를 마시고, 자기에 대한 투자를 합리적으로 하는 인간형. 겸손하기보다는 자기주장이 강하고, 그러면서도 예의바른 레이디즈 앤 젠틀맨.
이건 환상이다. 현실은 12시의 종이 울리면 항상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신데렐라의 운명보다 얄궂다. 대다수의 ‘일상’을 살아가는 삶은 이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환상은 드라마에서, 그리고 영화에서 펼쳐질 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쪼잔하고 치졸하다. 아래층 셋방살이하는 사람과 집주인은 전기세 몇 천원을 더 받고 덜 받고 때문에 옥신각신한다. 동네에 사는 아무개가 결혼을 갑자기 결혼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예민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동네 아줌마들의 낙이 되곤 한다.
이러한 쪼잔하고 치졸한 이야기들이 한동안 소설에서 사라졌었다. 모든 이야기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으로 묘사되거나, 그 안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철저히 남성의 시선으로 보이곤 했다. 이명랑의 소설 <삼오식당>은 수다스럽고 우리 시대 보통사람들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리얼리즘은 역사의 거대한 맥락에서 민중이 어떻게 사는 가를 묘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인간 군상들이 어떻게 일상을 살고 있는 가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삼오식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절대다수이지만 자꾸만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p>
삼오식당은 영등포 시장터에 있는 밥집이다. 그 식당에는 과일 도매를 하는 장사꾼들이 들락날락하고, 그 장사꾼들한테 차를 파는 아줌마도 왔다 갔다 하고, 일수 찍으러 다니는 아줌마도 얼굴을 보인다. 사돈과의 상견례자리에서 거창하게 교양을 떨고 싶은데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사돈 말씀이 맞지라.”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밥집 아줌마의 이야기에서 가난하고 못 배운 엄마가 처한 상황에 공감하게 된다. 일만 죽어라 해서 무릎을 펼 수도 없고 절룩거리면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낙이 없는 건 아니다. 낮에는 고물을 팔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할머니는 누군가에게도 거들먹거리고 싶어 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풍문을 장터의 사람들에게 나르곤 한다. “삼오식당 둘째 년 알지? 고게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벌써부터 서방질을 하고 있더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기 인생의 설움을 약장수들이 하는 의료기 판매기 장에서 몇 백 만 원짜리 의료기를 사고 사람들에게 과시함으로써 깨끗이 씻어버린다.
수십 년 동안 생선가게를 했던 어떤 장사치는 벌이가 훨씬 좋았음에도 ‘고상한’ 장사를 하고 싶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과일가게로 전업을 한다. 장사는 안 되지만 순전히 사람들에게 냄새나는 생선장수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게 싫어서 그런다.
장볼 때에 백 원짜리 한 닢 더 쓰는 것은 아까워 벌벌 떨면서도 그 허영심을 조금만 누군가 자극하기만 하면 큰일을 저질러버리고 마는 사람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 우리의 ‘생활’의 초상이다.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참 유치한 짓이다. 사리에 맞게 하나하나 천천히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남의 집 “둘째 년”이 서방질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그 “둘째 년”의 문제일 테고, 사람들한테 고물장수라고 설움을 받든지 말든지 그것이 의료기를 사야할 정확한 연유는 아니다. 하지만 장터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작은 일에 쪼잔하게 시비를 걸고, 치졸하게 남의 이야기를 한다. 큰 이익은 셈할 줄 몰라서 결국에는 영리하고 잘 배운 사람들에게 당하면서도 작은 이익에는 집착하는 사람들.

‘서민’이라는 말, 또 조금 더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민중’이라는 말은 자꾸만 구체적인 일상을 까먹게 만든다. 사람들은 그냥 힘들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환희를 갖고 살아가고, 사회적 흐름 같은 거대한 일에 맞서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착하게 살기만 해서 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서민’이네 ‘민중’이네 혹은 ‘국민’이네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레이디즈 앤 젠틀맨’의 기준으로만 봄으로써 그 괴리를 키워왔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곳들을 밀어버리려고 혈안이다. 안 봐도 그만이니까 그렇다. 촌스럽고 만만해 보이니까. 재래시장들을 보호하겠다면서 뉴타운 개발로 상인들을 쫓아내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눈물로 망루를 쌓을 때 진압을 들어가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장터로 가서 “경제가 어려워 힘드시죠?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가서 밥 먹고 장을 봤을 뿐이다. 그들의 일상에 스며들 여지가 없었을 뿐더러 그럴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서민들을 안다고 말하곤 한다. 그런 식이라면 도시의 밑바닥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영영 알 수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