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나와 당신과 그의 서울 – 김애란 외, <서울, 어느 날 소설이 되다>, 강,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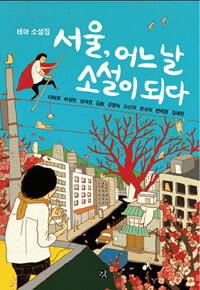
|
서울, 어느 날 소설이 되다 –  하성란.권여선.윤성희.편혜영.김애란 외 지음/강 |
|
2008/10/28 – [Book Reviews/Literature] – 모던 보이의 ‘모던한’ 사랑하기? – 이지민, 모던보이, 문학동네, 2008 2008/10/23 – [Book Reviews/Literature] – 지금 서울에 대한 풍자 – 윤고은, <무중력 증후군="">, 2008</a> 2008/12/05 – [Book Reviews/Literature] – 모던 뽀이 구보 성장기 in 서울 – 1 2008/12/05 – [Book Reviews/Literature] – 모던 뽀이 구보 성장기 in 서울 – 2 2008/12/11 – [Book Reviews/Liberal Studies] – 서울에 딴스홀을 허하라, 김진송, 현실문화연구 </td> </tr> </table>
서울. 그냥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일반적인 의미는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울’을 하루에 수십 번은 이야기하면서 살아간다. 하지만 ‘서울’이 모두에게 같은 의미는 아닌 것 같다. 다른 시간과 공간의 경험들은 서로 다른 서울을 느끼고 기억하게 한다. 소설집 <서울, 어느 날 소설이 되다>를 읽다가 새삼 다시 생각한다. 나는 1980년대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다. 모든 유년의 기억은 서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어린이 대공원으로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소풍을 갔다. 고등학교 때 처음 사귀려던 여자아이한테 강변역에 있는 CGV에서 <타이타닉>을 보자고 했고, 그녀와 두 번째 했던 데이트의 장소는 잠실역의 롯데월드, 세 번째로 만나 고백하고 퇴짜 맞은 장소는 인사동이었다. 반면 우리 아빠에게 서울은 스무 살의 나이로 처음 상경하여 1970년대 남대문 시장에 있는 큰 아빠의 옷가게 점원으로 ‘알바’로 일할 때 너무 추워 드럼통에 피워놓은 모닥불로 몸을 데우던 20대의 기억과 맞물려있다. <한지붕 세가족="">의 순돌이 아빠처럼 맨몸으로 서울하늘 보금자리를 틔우기 위해서 산전수전을 겪었던 기억이 있다. 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자취를 하면서 대학을 다녔던 내 친구와 선배와 후배의 서울에 대한 감각이 다르다.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생경함과 매정함으로 제 존재를 증명하는 이 도시가 그렇다고 제 고향인 사람들을 푸근하고 넉넉하게 받아주고 감싸주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을.”(p.156) </p> 또 서울 어디에 살았고, 사느냐에 따라 기억이 다르다. 사대문 안에 살았던 서울 토박이들과 1960~70년대 강남에 진출한 이들, 상경하여 서울 변두리의 서민들의 지역에 살았던 이들의 ‘서울’은 각기 전혀 다른 의미이다. 북촌 한옥 마을에 사는 사람과 그곳에 디카를 들고 사진을 찍기 위해 돌아다니며 탄성을 지르는 사람들의 차이처럼 말이다. 노는 곳이 달라도 또 다르다. 홍대와 대학로의 문화적 느낌과 강남역과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서 노는 사람들의 감성도 차이가 있을 듯하다. 그래서 서울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다채로운 빛깔을 내곤 한다. 정이현의 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이나 정수현의 소설 <압구정 다이어리="">에 나오는 도회적인 분위기의 서울이 있는 가하면, 영화 <오아시스>나 <복수는 나의="" 것="">에 나오는 어둡고 우울한 서울의 이야기가 가능하기도 하다. 드라마 <서울의 달="">에서 보여주었던 가난한 서울의 이야기도 물론 가능하다. 600년이나 쌓인 도시의 역사만큼, 그리고 서울이라는 공간에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섞여서 살게 된 만큼 다채로워 진 것이다. 서울의 인구가 많은 것 자체는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p> 하지만 서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집행을 장악하고 있는 당국은 전혀 그런 이해가 없는 듯하다. 2008년 8월 26일 서울 시청 본관이 헐리는 것과, 2009년 1월 20일의 용산에서 철거민들의 참사는 그것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오랜 시간동안 사람들의 발걸음이 머물며 추억거리를 만들었던 공간은 ‘낡은 것’이 되어 새로운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동네 사람들이 머물러 맥주 한잔을 걸치고 세상 시름을 나누던 동네 시장의 상가들은 ‘뉴타운’을 위해서 철거되어야 할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그것을 막는 철거민들은 ‘떼쟁이’가 되어버렸다. 버려져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신음, 그리고 그 주검에서 나는 악취가 진동한다. “날이 더워지자 A구역에선 점점 불쾌한 냄새가 났다. 오래된 건물 자재와 쓰레기 더미가 폭염 아래서 썩어가는 냄새였다. 그 속에는 거기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의 체취도 섞여 있었다. 나는 그게 빈곤의 냄새라고 생각했다.”(pp.248-249) 한 동안 유행했던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로 대표되는 ‘뉴요커’의 상징은 한국의 도시인들에게 꿈으로 소비되곤 했었다. 하지만 뉴욕에는 맨해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브루클린도 있다. 폴 오스터의 소설 <브루클린 풍자극="">은 명품과 파티에 중독된 ‘뉴요커’와 상관없는 뉴욕에 사는 서민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잘나가는 뉴욕 양키즈를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상과 닮아있는 뉴욕 메츠를 응원하는 뉴욕의 서민들. 게다가 맨해튼의 화려함의 뒷켠. 할렘이 있지 않는가. 뉴요커의 욕망을 선전하는 이들의 내면의 불온함을 의심하게 된다. </p> 여전히 다채로운 서울. 앞으로도 계속 서로 다른 ‘나와 당신과 그의 서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길 기대하면서 책을 덮는다. </d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