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착한 급진주의자의 분노를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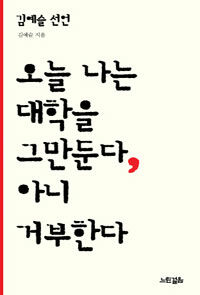
|
김예슬 선언 –  김예슬 지음/느린걸음 |
책을 읽는 내내 ‘울분’이 느껴진다. 자본의 이익이 만들어주는 탐욕에 대한 분노, 거기에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다. 그녀의 시위와 대자보와 마찬가지의 감정이 책에 느껴진다. “‘진리’는 학점에 팔아 넘겼다. ‘자유’는 두려움에 팔아 넘겼다. ‘정의’는 이익에 팔아 넘겼다“(p.35). 어떤 실증적 자료로도, 철학적 논변으로도 반박할 수 없다. 글에는 의지와 그 의지에 기반을 둔 사자후가 넘쳐흐르기 때문이다. 그녀에게는 ‘공감’하거나 반대로 ‘냉소’하거나의 반응을 보이는 게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 혹은 “딱도 하다, 아직 세상 물정도 몰라서 그럴 수 있는거야”식의 ‘동정’도 있을 수는 있겠다. 이런 글을 읽을 때 사람들이 보통 ‘냉소’하게 되는 것은 이런 강한 ‘집념’을 보였던 사람들이 대체로 그 이후에 보여준 집념의 ‘전향’ 덕택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녀가 일단 한 몸 던져 ‘진정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냉소가 더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냉소는 그나마 2달을 못 넘기고 있다. 그냥 그녀는 ‘또라이’가 되어버렸다.
책에는 ‘또라이’라는 말이 참 적절하게 대구를 이룰만한 표현이 있고, 이 표현에 대해 몇 몇이 지적한 바도 있다. 바로 ‘래디컬‘이다.
“우리 사회 진보는 이러한 근원적인 가치투쟁에서 매일 매일 패배한 듯이 보였다. 그 결과가 ‘탐욕의
포퓰리즘’을 들고 나온 이명박 정부 집권으로 귀결된 것이리라. 내가 접해온 진보는 충분히 래디컬하지 못하기에 쓸데없이 과격하고,
위험하게, 실용주의적이고, 민망하게 투박하고, 어이 없이 분역적이고, 놀랍도록 실적경쟁에 매달린다는 느낌이 든다. 그것은 실상
물질적이고 권력정치적이고 비생태적이고 엘리트적이고 남성중심적이고 삶의 내용물에서 보수와 별반 다르지 않게 보였다“(p.71). 박권일은 김예슬의 이 주장에 대해 비판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구체적 사실’이 없기 때문에 반증 불가능하다. 나 역시 동의를 한다. 다만 김예슬의 텍스트에 대해 ‘성찰점’을 갖고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에는 특별히 동의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글은 애당초 ‘토론’을 위한 텍스트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비판’과 ‘토론’이 별로 필요해보이지 않는다. 용도가 다르다. ‘파토스’를 발견하면 그만이 아닐까.
다만 나도 김예슬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긴 하다. 김예슬은 “청년실업 해결과 사회복지 확충과 88만원을 188만원으로 올리는 권리 요구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연대할 것이다. 하지만 연대를 이유로 나의 래디컬한 인식과 실천을 유보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나는 대중성과 현실성의 이름으로
나의 문제제기와 실천을 하향평준화시키는 실용주의, 중도주의, 연대주의에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p.82)라거나 “기꺼이 억압 받고, 상처 받고, 저항할 것이다. 나는 그 저항의 길을 내가 먼저 걸어갈 것이다. 멈추지 않는 작은 돌멩이의
외침으로!“(p.117) 살겠다고 말하는데. 이런 ‘결의’를 가지고 사는 운동은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를 몸으로 보여주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결의’없이 사는 사람 중에는 급진주의자 혹은 ‘래디컬’이 없냐는 말이다. 조금 더 양보해서 그람시가 “지성의 비관주의와 의지의 낙관주의”를 말할 때에도 그는 ‘낙관주의’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틈새들을 비집고 들어가는 래디컬들의 실천을 말했던 것인데.
김예슬 방식으로는 전면으로 자본주의와 “맞장 뜨자”말고는 별로 길이 없긴 하다. 지금 보여주는 ‘착한 급진주의자’의 분노는 세상을 바꿀 수 없을 듯하다. 감수성의 집단적인 변화는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이를테면 랑시에르의 ‘미학적 차원’), 그건 혼자만으로 되는 건 아닐테니 말이다. 어느날 신내림을 받거나, ‘원체험’을 하는 사람의 감수성이니 말이다. 요컨대 유도리가 없다. 그리고 조금만 삐쭉 대면서 신랄한 우디 앨런이나 채플린의 너무나 웃겨서 비장한 식의 유머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쉽게 말하자면 <나눔 문화=""> 바깥에서도 먹혀야 한다는 거다</span>.
</p>
물론 책 한 권을 읽고, 연설을 읽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랄 일은 아니다. 다만 난 그녀가 이 책의 결계에 갖히기보다 상처받으면서 얻는 저자 거리의 진리를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바꿀 수 있는 갖췄으면 좋겠다는 정도다. 인문’학’이 아니라 인문’삶’을 살겠다 했으니, “두고 볼 일이다!” 지금의 ‘결의’가 투박한 ‘일상의 도덕’이 되고, ‘적확한 표현’들이 시장에서 나물파는 할머니의 욕짓거리에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언젠가 그녀의 숙성된 ‘래디컬’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싶을 따름이다.
 </div>
</div>